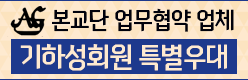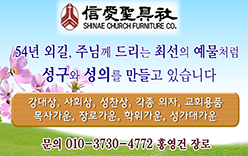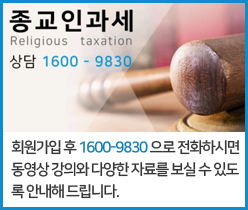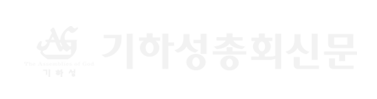현대 설교의 흐름(ⅩⅩⅧ)
조지훈 교수(한세대학교 설교학)
페이지 정보
25-07-14 09:36관련링크
본문
찰스 캠벨의 설교학에 영향을 준 한스 프라이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 지적하면 등장한 후기자유주의 신학
성경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강조해

설교자라면 누구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길 소망한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 철저한 원고 준비, 준비된 원고의 정확한 전달 등등 설교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 이론과 방법론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교 이론을 소개하고 설교 방법론을 제시하는 글을 연재한다. 목회 일선에서 오늘도 설교 준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현대 설교학 지형도에서 찰스 캠벨(Charles L. Campbell)은 매우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가 새로운설교학운동에 대해 적절한 비판과 함께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1997년도에 낸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프리칭 예수: 한스 프라이의 탈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학의 새 지평』, 이승진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찰스 캠벨이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차용하는 것은 예일대학교에서 조지 린드벡(George A. Lindbeck)과 함께 후기자유주의 신학(postliberal theology)을 이끌었던 한스 프라이(Hans W. Frei)의 신학이다. 그러므로 캠벨의 설교학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기대고 있는 한스 프라이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post’라는 접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후기자유주의 신학’(after liberal theology)이라고도 불리지만 ‘탈자유주의 신학’(against liberal theology)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 - 특히 독일 - 을 중심으로 발흥했던 자유주의 신학은 근대주의(modernism), 곧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시대 정신의 영향 아래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거나 재진술함으로써 기독교를 변호하려는 신학이다(목창균, 『현대신학논쟁』, 15-16). 목창균 교수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제한받지 않음”이라고 정의한다. 그 특징이 “어떤 사상 체계나 입장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 “개방된 마음, 관용, 진리에 대한 겸허하고 헌신적인 태도”라는 것이다(목창균, 15).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첫째, 신학의 토대를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 둔다는 것, 둘째,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는 것, 넷째, 낙관주의적인 인간관을 주장한다는 것, 다섯째, 기독교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 여섯째, 현대 과학과 기독교 전통을 중재하려고 했던 것 등이다(목창균, 28-29). 그 특징에서도 보여주듯이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나 상황(context)이다. 이것은 이 신학의 변증적인 성격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즉, 자유주의 신학은 성서의 진리를 시대 정신과 모순되지 않게 설명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상관주의(relationalism)라고 하는데, 기독교와 현대 문화 사이의 상관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상관주의는 기독교와 문화 사이의 공유점을 찾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의 보편성을 찾고 이를 근거로 기독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서가 가진 그 자체적인 언어의 세계나 기준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나 인식과 상관적(correlate)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동건, “한스 프라이 신학의 특징: 서사와 언어”158-159).
어떤 의미에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시도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인간의 종교 의식과 경험이라는 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었고 이성과 과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들여다봄으로써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 - 예수님의 선재성,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기적, 성경의 무오성 등 - 을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이런 결과로 인해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의 핵심을 상실하고 기독교를 계시 종교에서 윤리 종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종교에서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종교”로 만들고 말았다(목창균, 29-30).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1960년대 드러나기 시작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의 학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조지 린드벡과 한스 프라이 등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들과 제자들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 학파라는 점에서 ‘예일학파’(Yale Schoo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속하는 학자들은 린드벡과 프라이 외에도 윌리엄 플래쳐(William Placher), 스탠리 하우워스(Stanley Hauerwas), 조지 헌싱거(George Hunsinger), 폴 홀머(Paul Holmer), 데이빗 켈시(David Kelsey) 등이 있다.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 경험에 토대를 두었던 자유주의 신학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입장”을 말한다(김운용, “전환기 한국교회를 위한 설교 사역을 위한 실천신학적 탐구: 찰스 캠벨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275).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이야기성에 주목하며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자유주의자들은 근대 정신의 특징 중 하나인 보편성에 근거해 인간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성경 외적인 요소들, 즉 인간 경험과 윤리적 원리를 통해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스 프라이는 그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이야말로 성경의 독특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 진리는 성경 외부의 어떤 것으로 확보되거나 보증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기독교 진리 탐구는 해석공동체인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인 해석학 이론을 통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와 실천들 속에 구현된 성경 해석을 위한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건, 164).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성경을 해석해온 해석 공동체이며 성경 본문은 “정적으로 머물러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공동체가 본문을 해석하며 대화해온 언어와 전통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으로 행동하는 본문(the acted text)”인 것이다(김동건, 164). 자유주의 신학이 보편성을 강조했다면 프라이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특수성, 곧 성경과 교회 공동체의 특수성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