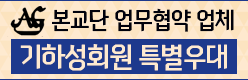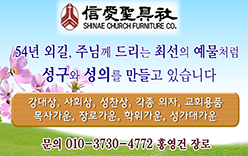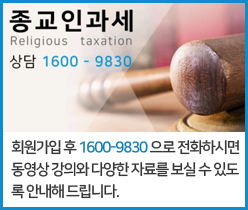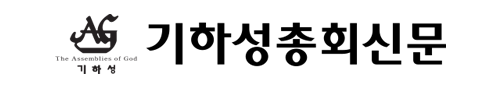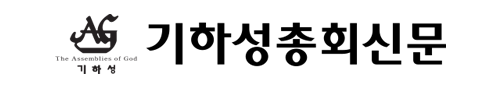현대 설교의 흐름(ⅩⅩⅦ)
조지훈 교수(한세대학교 설교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5-07-01 14:34본문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의 신앙의 고백 되어야
설교 통해 회중들의 상상력이 자극되어야
회중들은 설교 통해 스스로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설교자라면 누구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길 소망한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 철저한 원고 준비, 준비된 원고의 정확한 전달 등등 설교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 이론과 방법론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교 이론을 소개하고 설교 방법론을 제시하는 글을 연재한다. 목회 일선에서 오늘도 설교 준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지난 호에는 로시 앳킨슨 로즈가 제시하는 ‘대화 설교’에 있어서 설교의 목적과 설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대화 설교’에서 제시하는 설교의 언어와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로즈가 제시하는 대화 설교는 설교 언어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 즉 고백적인(confessional) 특징과 환기적인(evocative) 특징을 강조한다. 로즈는 설교가 가지는 고백적인 특징을 논하기 위해서 토르 홀(Thor Hall), 조셉 지틀러(Joseph Sittler), 헬무트 틸리케(Helmut Thielichke)의 주장을 인용한다. 신앙의 언어는 단순히 언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언어의 일부이다. 그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신앙의 확신 역시 단순한 확신이 아니다. 그 확신의 주체는 그 확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 언어의 특징은 그것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의 언어는 신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들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남긴 영향력을 통해서 얻은 확신을 나타내주는 고백적인 언어이다”(로즈,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 설교』, 219).
설교의 언어가 환기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 다의성(multivalence)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설교 언어의 환기적인 특징을 논하는 과정에서 로즈가 인용하는 학자는 버나드 브랜든 스캇(Bernard Brandon Scott)과 프래드 크레독(Fred Craddock)이다. 스캇은 언어라는 것이 언어의 물리적인 소리나 문자의 조합으로서의 지시자(pointer)와 이 지시자가 의미하는 지적인 이미지로서의 개념(idea)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스캇에 따르면 언어의 문제는 지시자와 개념의 관계가 변한다는 것이다. 한 단어가 지시하는 개념이 고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언어의 의미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깊이 연관되어있고 그렇기에 관계적이고 상상의 상호작용(imaginative interaction)이 요구된다. 하나의 단어가 대화 상대자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발행한다. 반대로 독자는 저자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다. 크레독은 이와 같은 과정을 회중에 의한 의미의 활성화라고 명명한다. 회중은 설교자의 설교에 등장하는 쟁점이나 개념들을 통해 설교에 의식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설교자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그 침묵의 부분을 회중이 상상력을 통해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중은 자신들에게 맞는 새로운 의미와 통찰에 다다른다.
로즈가 제안하는 고백적이고 환기적인 설교 언어는 회중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전통적인 설교 언어와 매우 다르다. 공동체의 고백의 언어로서 설교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 설교자 한 사람이 제시하는 규범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중이 행하는 각자의 고백이다. 설교를 통해 회중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신앙고백을 행하는 것이다.
로즈가 제시하는 대화 설교에서 설교 형식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의 형식이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로즈는 각각의 형식이 여러 종류의 경험을 각각 담아내는 틀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설교학에서 설교 형식의 목적은 설교 메시지나 핵심사상을 통해 객관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케리그마 설교학에서 설교 형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케리그마를 소통하는 것이었다. 새로운설교학에서 설교 형식은 회중의 가치, 태도,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전달하는 도구였다. 반면 대화 설교에서 설교 형식은 “신앙 공동체를 교회의 중심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에 집중한다”(로즈, 216).
로즈는 설교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설교 형식에 대한 그의 생각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강조점의 변화를 논한다. 첫째, 개별적인 설교(individual sermon)의 효과로부터 설교의 누적적인 효과(cumulative effect)로의 강조점의 변화이다. 케리그마 설교학과 새로운설교학에서는 구원사건으로서 또는 변혁적인 사건으로서의 개별적인 설교를 강조했다. 그러나 로즈는 누적된 설교가 갖는 효과에 주목한다. 설교를 교육과 연결시켰던 전통 설교학에서는누적된 설교의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둘째, 기존 설교에서 설교자가 정해진 답을 청중에게 강요했던 것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의미를 찾도록 돕는 열린 담화로서의 설교를 강조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설교를 닫힌 담화로 생각한다. 그러나 로즈는 설교가 연설과 같이, 즉 질문과 토론의 여지가 있는 연설과 같이 열린 담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설교 형식과 관련하여 로즈가 말하는 강조점의 변화는 설교를 예술로 생각하는 것이다. 로즈에 따르면 예술이란 예술가가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를 예술적인 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무엇이 아니다. 오히려 “예술이란 예술가가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로즈, 218). 이와 같은 내용을 로즈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어떤 예술은 예술가가 미리 파악한 의미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시도하는 어떤 전략(strategy)가 아니다. 일부 예술은 예술가 편에서 이미 경함한 의미에 대한 발견의 경험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면서 독자들이나 관람객들도 의미의 해석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행위이다”(로즈, 219). 따라서 의미는 예술가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품을 대하는 독자나 관람객도 스스로 발견하는 무엇이다. 로즈가 생각하는 설교 형식은 예술가의 활동처럼 설교를 듣는 회중이 설교자가 의미를 발견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